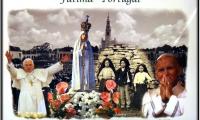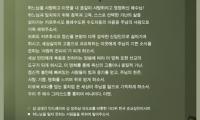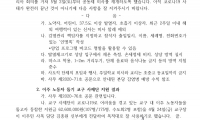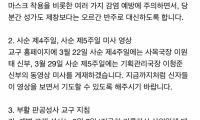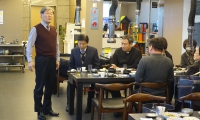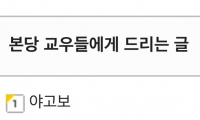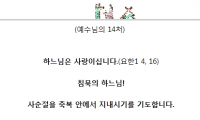광란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였다
그날 오후 3시. 가을 하늘은 잔뜩 심술이 난 듯 우중충했고, 금세라도 빗방울이 뚝뚝 떨어질 듯했다. 천호성지 순례를 마친 일행은 관광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는 지리산 자락 아래로 조용히 미끄러지듯 출발했고, 그로부터 시작된 건 ‘광란의 시간’이었다.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권주가는 분위기의 서곡을 알렸다. 잔이 돌고, 웃음이 피어났다. 누군가 수줍게 일어섰고, 또 누군가는 그를 따라 율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예정된 제1부 파티의 막이 올랐다. 그 시작은 서툴고 어색했지만, 봉사자들의 능숙한 바람잡이(?)가 빛을 발했다.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무의미한 그 시간 속에서 모두는 ‘막춤’의 주인공이 되었다. 버스 통로는 어느새 댄스 플로어로 변했고, 각자의 춤사위가 뒤엉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누구 하나 눈치를 보거나 망설이는 이 없었다.
이쯤 되면 잠깐의 휴식이 필요했다. 그러나 음악은 멈추지 않았고, 권주가는 다시 한 번 잔을 부추겼다. 이윽고, 막춤의 절정에 이르던 그 순간. 우리는 어느새 ‘하나’가 되어 있었다. 함께 웃고 박수치며 서로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는 사이, 공동체라는 이름의 울타리는 더욱 단단히 역겨가고 있었다.
막춤이 주춤거리자 차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짧은 침묵은 제 2부, ‘노래자랑’의 서막을 알리는 예고였다. 버스 스피커는 거칠게 음악을 토해냈지만,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중요한 건 함께 ‘부른다’는 것이었다. 한 곡, 두 곡.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오른 이들은 모두가 진지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허공을 향해 팔을 휘저으며 노래했다. 그 순간, 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었다. 그곳은 콘서트 무대였고 모두가 주인공이었다.
몇몇은 어깨춤을 추며 떼창을 했고, 누군가는 수화로, 박수로, 눈빛으로 응원했다. 달구어진진마이크는 식을 줄 몰랐다. 버스는 춤추듯 흔들렸고 마음도 함께 흔들렸다. 주연과 조연이 따로 없었다. 모두가 주연이고 감독이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버스는, 황금빛 대지를 끼고 쉼없이 달렸다. 가을걷이가 한창인 들녘 위로 지리산 자락은 고운 자태를 뽐냈고 있었다. 그 시간, 차창 밖 경호강은 우리를 응원하듯 따라 흐르고, 나는 그 여울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다.
그 풍경에 취해 정신이 혼미할 무렵, 마지막 무대 3부가 시작되었다. '가무'에 이어 등장한 각자의 ‘끼’가 터지는 즉석 무대였다. 손짓, 발짓, 언어유희까지...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의 공연자, 하나의 주연' 이 되어 있었다. 어떤 이는 수줍게 노래 한 소절을 흥얼이고, 어떤 이는 엉뚱한 춤사위를 선보였다.
무대를 휘젓던 바람잡이 봉사자매들은, 어느새 맛깔스런 양념처럼 깊은 여운을 남기고 무대 뒤로 사라졌다. 그들이 사라진 공간에는 박수갈채와 외마디 함성으로 가득했다. 황홀했던 우리만의 무대에는 미숙함도 완벽함도 없었다. 다만 겸손과 배려, 사랑이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무대 주인공들의 삶의 자리는 다양했다. 주부, 직장인, 은퇴자, 자영업자, 그리고 다양한 봉사자... 겉보기엔 평범한 얼굴이지만, 그 속엔 수많은 사연과 무게가 담겨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 외로움, 경쟁, 불안…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되는 여흥 속에서 모두가 아름답고, 자유롭고, 어둠 속의 빛이였다는 사실이다. 함께했던 그 시간, 우리는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았다. 춤과 노래, 웃음이 가득했던 광란의 무대에서 심연의‘가슴앓이’을 걸러냈다. 그리하여 다시 걸어갈 힘을 얻었다.
누가 이 무대를 지휘했는가.
누가 이 파티의 주인공이었는가.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의 연출자는 바로 주님이셨음을.
버스에서 펼쳐진 광란의 공연,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몸과 마음으로 확인한 시간이었다. 그날의 무대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작은 천국이었다. 우리는 짧은 여흥 속에서, 모두가 '덕산'의 주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했다. 또한 신앙의 여정에서, 함께 나가야 할 ‘이웃’임을 새삼 깨달은 은총의 시간이었다.




_2.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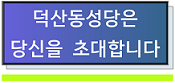
_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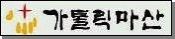


_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