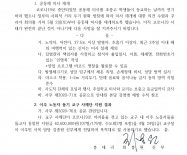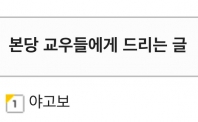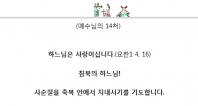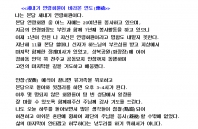“주니이이이...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나이를 먹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요즘은 아침마다 거울보기가 민망스럽다.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나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
지난 삶의 자취들, 인생의 역정들, 수많은 사연들을 얼굴 속에서 읽어 본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뒤돌아보면 삼십 수 년 전 입문했던 가톨릭 신앙은 인생에
목마르고 진실에 굶주리던 나에게 진리와 깨달음의 입문이었다.
그럼에도 가뭄의 콩밭에 싹이 돋듯 기껏해야 한 해 두세 번 보는 성사에는
아직도 친숙하지 못하고 어찌 그리 부담스럽게 다가오는지 모르겠다.
머리에 재를 얹고 시작된 사순시기,
제2주간 중반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부부 관계부터 생각해 본다.
가까우면서도 멀고, 멀면서도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부부(夫婦)의 호칭에
남편의 글자 夫(지아비 부)가 앞에 있는 것은 남자의 지체가 높아서가
아니라, 건장한 남자가 힘든 일을 먼저 하라는 의미라고 한다.
한 그릇에 밥을 비벼 먹고, 같은 컵에 입을 대고 물을 마셔도
괜찮은 사이. 너무 좋아 죽을 것 같은 허니문을 넘기고, 서로가 너무
익숙해지고 권태를 느끼며 결혼 자체의 가치도 의심스러울 때,
그것을 넘어야 진정 새로운 부부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부부 관계도 환멸을 느껴봐야, 넘어져 봐야, 좌절해봐야 알 수 있는 관계다.
성금요일 없이 어찌 부활절 아침이 오겠는가!
죽어야 만 부활을 체험하듯 부부관계도 죽을
고비를 넘겨봐야 성숙한 관계로 승화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내 삶은 사순절도, 성금요일의 살을 찢는 고통도, 죽음의 십자가도
없이 부활절만 바라보며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본다.
영원할 것 같고 무한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어이없게도 살아온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그것은 별일 아닌 소소한 순간의 일이었다.
연령회장이라는 완장을 차고 있는 나는 상.장례 봉사를 하지만,
어디까지가 고인과 유족을 위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자신을
드러내려는 이기심과 욕심을 위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교만은 독사의 입에 머리를 처박는 일이라고 누군가가 말했다.
그런 마음이 일 때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찾는다.
‘까부는구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질타하는데도,
그놈의 교만과 욕심과 집착은 버리고 버려도 껌딱지처럼 달라붙는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응시하며 겸손과 비움과 낮춤이 있는가(?)
되물으며 작심삼일이 아니기를 나는 염원한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께 참으로 죄송스럽지만,
내 심연에는 세상사의 잡다한 것으로 가득 채워진 곳간이 있다.
더 늦기 전에 곳간의 벽을 허물고 들어내고 비워야 한다(!)고 다짐한다.
그 곳간에 찢어지고 먹히는 작은 희생의 사랑을 채워보자(!)고 또 다짐한다.
어떤 것도 빈자리가 있어야 채울 수 있으니까!
정녕 하느님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얄팍한 나를 다 불살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깨끗한 고요함으로 주님의 부활대축일을 맞이하고 싶다.
나는 음치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데 가끔씩 '마이 웨이(My Way)' 를 듣곤 한다.
왜냐면 그 가사가 좋아서다. 삶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겠다면서,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았지만 나는 내 인생,
나의 길을 내 식으로 살았노라고 한다.
그러면서 남자가 인생을 돌이켜보며 가진 게 무엇이냐고,
남는 게 무엇이냐고, 만약 그 자신을 가지지 않았다면(?) 하며 반문한다.
그런데 나는, 마이 웨이 가사의 그 남자와 달리
복음서의 어느 부분을 읽을 때면 꼭 걸리는 분이 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의 길을 산 사람이다.
남의 길을 위해 자기 삶을 바친 사람이었다.
자기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더 커지도록 자신의 일생을 다 바친 사람,
자신은 그분의 신발 끈조차 풀 자격이 없다며 자기를 낮춘 사람,
그렇게 사신 분이 세례자 요한이다. 그래서 이분이 때때로 걸린다.
이분의 예기를 복음서에서 아에 뺏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분이 하심(下心)을 실천한 분이다.
그렇게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역설적으로) 내게는 걸림돌이다.
나의 어리석음이 어디 그뿐인가.
‘남의 발을 닦아 주라고, 남이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해 주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부서지고 쪼개지는
당신의 육신과 피로 속량하시어 모든 인간을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게 하는 분,
당신의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니이이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이 땅의 좋은 소출을 먹게 되리라.”
(이사1,18-19)라고 하신 말씀에 한없이 부족한 나는
위로와 용기를 얻고 내일을 바라본다.
아멘!!!
 5월 마르꼬회 개최.....
5월 마르꼬회 개최.....
 3월 마르꼬(장년회)개최후 2차주회실시.....
3월 마르꼬(장년회)개최후 2차주회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