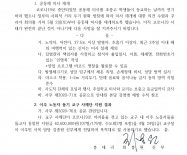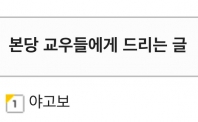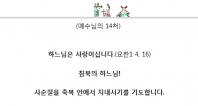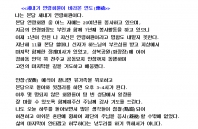위령미사에 잠긴 상념(想念)
지난 11월 2일 토요일, 청명한 하늘아래 만추의 따뜻한 햇볕은 경화동 산비탈을 비추고 있었다.
그 햇살아래 천주교 공동묘지에서는 여느 해처럼 진해지구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되었다,
미사에 앞서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한 연도를 바쳤다. 연도는 죽은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산 사람이 대신 기도해서 죄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령미사 중 - 성체 분배
오늘이란 말은 때로는 싱그러운 꽃처럼 풋풋하게 생동감을 안겨 준다.
이른 아침 산책길에서 한 모금의 시원한 샘물을 마시는 듯 그 신선함 말이다.
누구나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오늘을 맞이하고, 하루 일을 머릿속에
디자인하는 모습은 한 송이 꽃보다도 아름답고 싱그럽기조차 하다.
그 사람의 가슴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어린 연두 빛 나무들이 진초록의 성하(盛夏)를 향해 달려가고 있나 했는데, 억새
군무와 만산홍엽(滿山紅葉)의 산야가 빚어낸 만추의 향기는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자연의 섭리는 언제나 신비 그것이다.
수레바퀴 같은 삶의 여정에서 맺은 인연들이 영원이 이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삶을 다하는 생명체는 반드시‘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다다른다. 종착지인 만큼 그 이상은
없다. 어떠한 움직임도 기대할 수 없고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수명이 다한 상태를
죽음이라 일컫는다. 종착역에 다다른 열차는 폐기되지 않고 새로운 노선으로
옮기어 또 다른 출발역에 서게 된다. 끝이 없는 삶이 아니라,
끝이 또 다른 시작에 맞닿아 있는 삶이‘영원’이다.
그럼에도 아쉽고 애달픈 사연을 안고 이승을 떠난 망자를 배웅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인연의 고리를 단절하기에는 그가 차지했던 빈자리가 크게 남아 있기에 슬픔과
그리움의 혼돈에서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진정한 삶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먼 길을 왔으며, 또 얼마나 먼 길을 가야하는가.
죽음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이지만 오직 인간만이 언젠가는 삶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존재다. 그럼에도 죽음에 대한 진지한 생각은 포기한 채 익숙하고 애정이 깃든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마치고 싶어할 뿐이다. 나는 연령회원으로 갑작스러운 부음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때마다 타인의 죽음을 통해 나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아니, 어디서 어떻게 죽어갈 것인가. 이 시대 우리에게는 죽음보다 죽어감의 과장이 더
중요해진 것 같다. 그래서 만성퇴행성 질병이나 장기적인 투병보다 차라리 짧고 간결한
죽음을 원하는 것은 나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가족조차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곁을 지켜 주기가 쉽지 않다.
원통하게 비명횡사(非命橫死)한 경우가 아니면 요즘에는 유족들도 별로 울지 않는다.
부모를 따라서 화장장에 온 유가족과 청소년들은 대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 폰으로
게임 등을 한다. 제 입으로“우리는 호상(好喪)입니다.”라며 조문객을 맞는 상주도 있다.
이승을 떠나는 고인의 마지막 날은 바쁘다. 이른 시각 출관예식과 장례미사, 화장과
안장예식에 이어 성당으로 돌아와 뒷정리를 하는 것으로 장례예식 봉사가 끝난다.
그런 날이면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을 생각한다.
죽음이 저토록 가벼우므로 남은 삶의 하중을 버티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화장이 끝나면 고인이 지상에 남긴, 한없이 고운 한 줌의 뼛가루는 인간 육체의
마지막 잔해로서 많지도 적지도 않고 적당해 보인다.
유골 수습실에서 유가족 틈 사이로 바라본 고인의 뼛가루는 흰 분말에 흐린 기운이 스며서
안개 색깔이다. 입자가 고와 먼지처럼 보인다. 아무런 질량감도 느껴지지 않는다.
물체의 먼 흔적이나 그림자 같을 뿐이다. 뼛가루의 침묵은 완강했고,범접할 수 없는 적막
속에서 세상과 작별을 하고 있었다. 금방 있던 사람이 금방 없어졌는데,
뼛가루는 남은 사람들의 슬픔이나 애도와는 사소한 관련도 없었고,
언어도단적인 인간 생명의 종말로서 합당하고 편안해 보였다.
죽으면 말길이 끊어져서 죽은 자는 산 자에게 죽음의 내용을 전할 수 없고,
죽은 자는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인지할 수 없다.
인간은 그저 죽을 뿐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다.
잔인한 표현이지만 죽음은 날이 저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자연현상이 아닐까.
인도의 법구(法救)가 석가모니의 금언(金言)을 모아 기록한 경전,
‘법구경(法句經)’에 나오는 이야기다. 걸음마를 하던 아들이 갑자기 죽자,
슬픔과 비통에 빠진 엄마는 아들을 되살릴 약을 찾아다녔다.
마침내 자신을 찾아온 그 여인에게 붓다는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의 겨자씨 한 줌이면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 약을 찾아 나선 여인은 곧 알게 됐다.
세상에 그런 집이 없으니,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그건 우리가 삶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리라.
삶과 죽음은 낮고 밤과 같은 것은 아니다. 죽음은 황혼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건 죽어감에 가깝다.
죽어 감은 살아감과 마찬가지로 시간 안에서 지속되는 것이다.
죽어 감은 삶의 일부다.
잠시 화제를 바꿔본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
나오는 어리석은 농부 이야기는 언젠가 주님 신부님께서 강론을 통해 말씀하신바 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어리석은 농부는 빈농의 소작인으로 시작해 부자 지주(地主)가
되었지만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힌다. 새로운 땅을 찾아 먼
고장으로 갔고 드디어 풍요로운 유목지의 멋진 땅을 찾았다. 땅 주인과 매매 계약의 조건은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걸어서 둘러본 만큼의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리석은 부자 농부는‘조금 더, 조금 더!' 하며 한 보라도 더 넓은 땅을 사기위해
멀리까지 갔다. 해가 저물어 가자 걸음을 재촉하고 뛰어서 출발 지짐에 도착했지만
과로에 지친 어리석은 부자 농부는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다는 얘기다.
톨스토이가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는‘소유가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전부라는 인생관을 갖고 산다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난다는 교훈을 남겼다.’세상사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인간이 세상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왔지만 떠나갈 때는 쥐었던 손을 펴고 생을 마감한다.
그럼에도 소유욕의 노예가 되면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는 불변의 진리도 망각한다.
결국 어리석은 부자 농부는 무엇을 얻었나? 어두운 땅 밑에 자신의 몸뚱이
하나 눕힐 6척의 구덩이가 아니었던가.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내 안에도 어리석은 농부의 욕망은 꿈틀대고 있지 않은가 반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떠오른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많은
소출을 거두어 더 큰 곳간을 짓고, 거기에다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고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려하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루카 12,20-21)
높은 곳에서 누리는 호사스런 생활보다 낮은 곳에서 다 함께 어울려 사는
그 담박함이 더 낫다는 것을! 혼자서누리는 특별함보다 더 함께 나누는
평범함이 더 낫다는 사실을, 사랑을 하면 그렇게 알리라!
일생을 살면서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나의 화와 속풀이를 받아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축복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분, 내 이야기를 온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분이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은 당신 마음을 ‘온유’라고 하신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온유(溫柔)이다.
긴 넋두리를 마치며 가끔씩 기억하며 묵상하는 격언,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다.'
라고 한 소포클레스(Sophocles) 말에 시간이 멈춰진다.
 [밀알성물회] 피정
[밀알성물회] 피정
 진해지역 성령 은혜의 밤
진해지역 성령 은혜의 밤